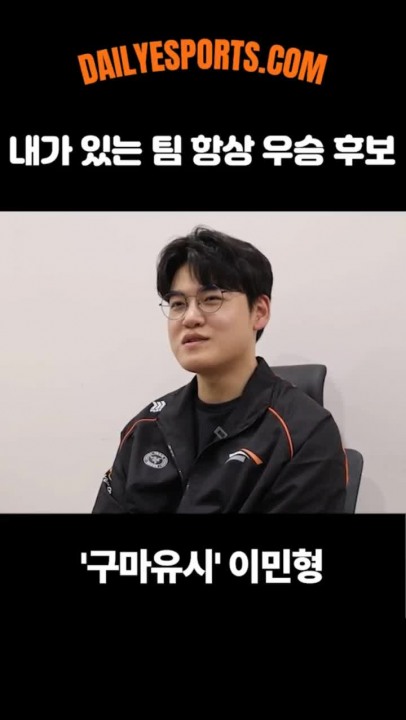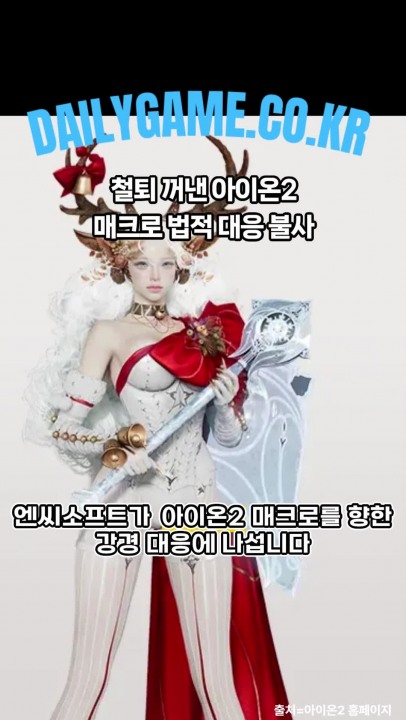한국은 2012년 처음 롤드컵 출전권이 배정됐을 때부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강호로 떠올랐다. 아주부 프로스트와 나진 소드가 출전했고 두 팀 모두 8강에 진출했으며 아주부 프로스트는 준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출전 첫 해부터 대박을 터뜨렸다. 2013년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SK텔레콤 T1이 한국 대표로 뽑혔고 롤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은 각광을 받았다. 2014년 삼성 갤럭시 화이트와 삼성 갤럭시 블루가 롤드컵 4강에서 맞붙었고 화이트가 정상까지 오르면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2015년에는 SK텔레콤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사상 첫 2회 우승팀이라는 기록을 세웠고 2016년에도 정상에 서면서 사상 첫 2연속 우승, 사상 첫 3회 우승팀이 됐다. 2017년에는 삼성 갤럭시가 우승하면서 팀 역사상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고 한국은 5년 연속 롤드컵 우승팀을 배출했다.
한국 지역이라 불리는 LCK와 다른 지역의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LCK라고 해도 방심하거나 실수하면 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이번 대회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아도 지는 상황까지 등장했다. 해설자들이 자주 쓰던 'Gap is closing(갭 이즈 클로징)'은 올해를 끝으로 없어졌고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만 남을 수도 있다.
올해 한국 팀이 역대 최악의 성과를 낸 것은 불행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나타났어야 하는 결과다. LCK 팀들은 다른 지역보다 투자에 박하다. '페이커' 이상혁의 연봉이 30억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의 연봉은 중국이나 북미보다 낮다. 성과를 내면서 이름을 알렸다고 판단하는 선수들이 LCK를 떠나 중국 LPL이나 북미 LCS로 가는 일은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니다.

롤드컵 대회 기간에 보여준 팀들의 외부 활동에서도 LCK는 이미 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대표로 출전한 팀들을 응원하기 위해 팬들이든, 사무국이든 발벗고 나서서 응원 도구를 만들어 왔고 좌석도 예매해 놓았다. 유럽 팀인 프나틱마저도 단독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라이엇 게임즈가 나서서 롤런(LoL Run) 행사를 만든 것이 전부다. "중국팀이 경기하는 날은 오디토리움이 가득 차지만 중국이 없는 날이면 절반 밖에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팀들의 한국 관객들을 동원하는 능력은 떨어졌다.
한국에서 열리는 롤드컵이지만 한 팀도 4강조차 들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누려왔던 LoL 최강팀이라는 자리는 이미 내줬다. 모든 것을 원점부터 다시 생각할 때다. 선수들의 기량, 한국식 경기 운영 방식, 선수 육성과 지도자들의 역할, 리그 흥행을 위한 마케팅, 충성도 높은 팬 확보 등 리그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재점검해야 한다.
롤드컵 2018이 가져온 충격이 엄청나게 컸기에 선수단이나 관계자, 팬 모두 아프고 쓰리겠지만 한꺼번에 대형 사건이 터졌기에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만약 한 팀이 살아 남아 최종적으로 우승했다면 한국은 여전히 LoL 최강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것이고 올해 문제가 된 부분들은 하나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의 합성어다. 그렇기에 위험이 다가오면 기회도 따라 온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위험이라 적힌 쪽을 제대로 눌러서 기회를 극대화시켜야 할 때다. 상황 판단이 흐트러져서 기회를 누르는 누를 범하지만 않는다면 'LoL 최강 대한민국'은 부활할 수 있다.
남윤성 기자 (thenam@dailyesports.com)